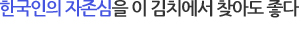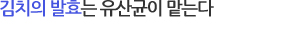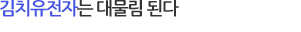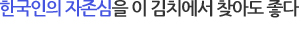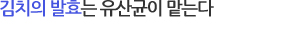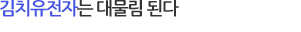|
김장은 ‘침장(沈藏)’에서 유래했다 하고, 김치도 침채(沈菜)에서 나왔는데 딤채→김채→김치로 바뀌었다고 한다. 김치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의 음식이다. 금강초롱이나 열목어는 우리나라에만 나는 고유종이라 하지 않는가. 말 할 필요 없이 김치 발효의 주인공은 미생물로, 발효식품에는 김치를 비롯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젓갈류, 술, 식초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미생물들도 있지만 알고 보면 거의 모두 유익하다.
김칫거리는 배추나 무가 주지만 열무, 부추, 양배추, 갓, 파, 고들빼기, 씀바귀 등 일흔 가지가 넘는다. 어디 김치를 배추 하나 만으로 만드는가? 무를 숭덩숭덩 잘라 채를 치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소금, 간장, 식초, 설탕, 조미료 등 갖은 양념은 기본. 아미노산이 그득한 멸치젓, 어리굴젓, 새우젓에다 호두, 은행, 잣 등의 과일류는 물론. 생고기인 북어, 대구, 생태, 가자미들까지 넣는다. 생선 단백질이 발효된 것이 젓갈이고, 김치에서도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김치를 마냥 절인 푸성귀 정도로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 비타민에다 고른 영양소, 유산(젖산)까지 그득 들어있는 종합 영양 식품인 것. 게다가 김치가 사스(SARS), 조류독감바이러스(AI)까지 잡는지라 세상 사람들이 홀딱 반해 난리들을 피운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이 김치에서 찾아도 좋다. 힘 줘 말하지만 김치를 먹지 않으면 한국인이 못 된다. 우리가 꿀릴 게 뭐가 그리 있는가. 몸에서 마늘, 김치 냄새 좀 나면 어때… 쓸데없이 뻐기는 자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긍심,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라야 남도 사랑한다는 것. |